“장애인이 사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판을 마련하다”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승호 사무국장]
“장애인이 사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판을 마련하다”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승호 사무국장]
by 안양교차로 2015.11.03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는 한없이 높기 만한 벽이다. 그래서 많은 중증 장애인은 이 벽을 넘기보다는 차라리 갇혀 사는 걸 선택한다. 하지만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도움닫기를 위한 디딤판을 만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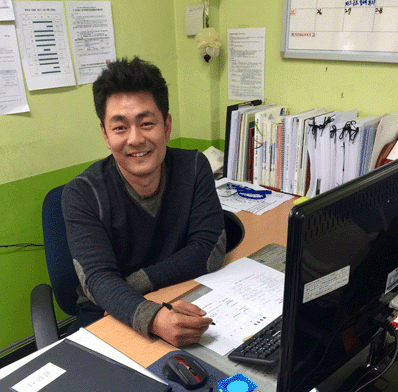
중증장애인도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기초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LP, 즉 장애인자립생활기술훈련이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은행업무 교육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자명하다. 이렇게 인지수준과 경제관념을 가진 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술 훈련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나 피자가게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기도 한다. 보드게임 슐런이나 휠체어 사이클 등의 레저 활동도 지원하며, 취미로 시작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공예와 염색 공예 등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완성한 수공예 작품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로까지 마련해준다.
사무국장인 최승호(38) 씨는 ILP와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캠페인 등 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다. ILP는 기간 선정과 강사 섭외부터 참가자들의 일정 조율, 진행이 끝난 후 후속 조치까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 준비보다 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활동이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먼저 계획하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그런데 ILP는 그 반대죠.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이 프로그램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독려해야 잘 진행된 ILP라고 할 수 있어요.”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기초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LP, 즉 장애인자립생활기술훈련이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은행업무 교육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자명하다. 이렇게 인지수준과 경제관념을 가진 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술 훈련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나 피자가게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기도 한다. 보드게임 슐런이나 휠체어 사이클 등의 레저 활동도 지원하며, 취미로 시작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공예와 염색 공예 등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완성한 수공예 작품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로까지 마련해준다.
사무국장인 최승호(38) 씨는 ILP와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캠페인 등 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다. ILP는 기간 선정과 강사 섭외부터 참가자들의 일정 조율, 진행이 끝난 후 후속 조치까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 준비보다 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활동이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먼저 계획하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그런데 ILP는 그 반대죠.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이 프로그램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독려해야 잘 진행된 ILP라고 할 수 있어요.”

다수의 인원이 아니어도,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야학도 마찬가지다. 초중고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단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 최승호 씨는 검정고시 서적 구매 등에 예산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일정을 계획했다. 그러자 단 한 명이었던 참여회원이 이제는 셋으로 늘어났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선은 문을 두드리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은 이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가 계획한 ILP 개수만큼 잊을 수 없는 추억도 함께 쌓였다.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커피를 30잔 이상씩 마셔야 했다. 한 잔, 한 잔 마시며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올려야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라테 아트를 완성시켜 가는 회원들을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늘 목에 하고 다니는 목걸이도 회원들이 준 선물이다.
단 한 명을 위한 문예활동 지원도 그의 역할 중 하나였다.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독자로서 객관적으로 글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고, 장애인재단이나 단체, 지자체 등에서 하는 공모전에 계속 작품을 제출하시도록 옆에서 부추겼죠. 이삼년 후에 제가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연다고 하시면서 저를 다시 떠올려주셨더라고요.
ILP가 어떤 거창한 성과를 거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향을 찾고,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모두 보람차고 좋았던 기억이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야학도 마찬가지다. 초중고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단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 최승호 씨는 검정고시 서적 구매 등에 예산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일정을 계획했다. 그러자 단 한 명이었던 참여회원이 이제는 셋으로 늘어났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선은 문을 두드리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은 이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가 계획한 ILP 개수만큼 잊을 수 없는 추억도 함께 쌓였다.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커피를 30잔 이상씩 마셔야 했다. 한 잔, 한 잔 마시며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올려야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라테 아트를 완성시켜 가는 회원들을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늘 목에 하고 다니는 목걸이도 회원들이 준 선물이다.
단 한 명을 위한 문예활동 지원도 그의 역할 중 하나였다.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독자로서 객관적으로 글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고, 장애인재단이나 단체, 지자체 등에서 하는 공모전에 계속 작품을 제출하시도록 옆에서 부추겼죠. 이삼년 후에 제가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연다고 하시면서 저를 다시 떠올려주셨더라고요.
ILP가 어떤 거창한 성과를 거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향을 찾고,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모두 보람차고 좋았던 기억이죠."

오랜 고민의 답, 더불어 살기
그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금 독특하다. 20대 초반에는 체육관을 운영했다. 언뜻 봐서는 지금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동사무소에서 체육관이나 학원에 교육을 부탁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내내 이 아이들을 돌보며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정책을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상업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체육관 운영에 회의를 느꼈다.
결국 체육관을 폐관하고 나서 이삼년 동안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다. 동시에 지방 곳곳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 도움을 드렸다. 그러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라면 한 박스 사다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전부일까’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많은 경험 중 그가 이 분야에 뛰어들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그의 친형인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이었다. 최승민 씨가 군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장애인 인권을 위해 공부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승호 씨는 ‘나 또한 이 길을 형님과 함께 갈 거라면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일을 시작했다.
“솔직히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어쩌면 이 답을 내리기 위해 그는 이 많은 경험을 거쳐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더불어 살기를 선택한 그는 앞으로도 복지 분야가 더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설이나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장애 등급 심사의 피해 방지가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방향이다.
“예산이 많다고 무조건 복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금 독특하다. 20대 초반에는 체육관을 운영했다. 언뜻 봐서는 지금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동사무소에서 체육관이나 학원에 교육을 부탁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내내 이 아이들을 돌보며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정책을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상업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체육관 운영에 회의를 느꼈다.
결국 체육관을 폐관하고 나서 이삼년 동안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다. 동시에 지방 곳곳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 도움을 드렸다. 그러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라면 한 박스 사다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전부일까’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많은 경험 중 그가 이 분야에 뛰어들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그의 친형인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이었다. 최승민 씨가 군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장애인 인권을 위해 공부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승호 씨는 ‘나 또한 이 길을 형님과 함께 갈 거라면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일을 시작했다.
“솔직히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어쩌면 이 답을 내리기 위해 그는 이 많은 경험을 거쳐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더불어 살기를 선택한 그는 앞으로도 복지 분야가 더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설이나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장애 등급 심사의 피해 방지가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방향이다.
“예산이 많다고 무조건 복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