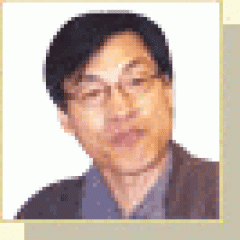제자리서 제몫하기
제자리서 제몫하기
by 이규섭 시인 2020.06.12

‘사무총장’이란 거창한 직함으로 퇴직기자 언론인 단체에 출근한지 반년이 다 돼간다. 600명 가까운 회원 관리 업무는 예상 보다 빡빡하다. 활자와 숫자 다루기 병행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로 발이 묶였던 문화역사탐방 현지답사를 하니 길 위의 날들이 떠오른다. “그 나이에 활동할 공간이 있다는 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위로의 말은 힘이 된다.
“사무총장 재미가 어때?” 조크 성 질문엔 “매일 열화상 카메라에 출연하는 재미와 화장실에서 덕수궁 용마루를 내려다보며 소피보는 짜릿함”이라고 농담조로 응수한다. 덕수궁 전경과 돌담 옆 성공회 성당 건물들이 드론 사진처럼 시야 가득 들어온다.
코로나 공포 속에 출근하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1층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놓고 체크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된다. 사무실 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열화상 카메라를 무사히 통과했으니 검증됐다며 주먹 인사를 한다.
지난 5월 하순 어느 날 내려다보니 성공회 성당 앞에 첨성대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닌가. 도포자락에 갓을 쓴 선비가 도심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 생뚱맞다.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해 10월엔 ‘서울 마루 2019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인 ‘소풍 지붕(소통하는 풍선 지붕)’을 설치하면서 ‘누리마루’에 대형 풍선 수십 개를 띄워 주변 경관을 망쳤다는 지적의 재연이다.
경주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이 조형물은 자동차의 폐(廢) 헤드라이트를 재생시켜 밤이면 빛을 내는 작품 ‘환생’이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서울시 예산 65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했다. ‘천년의 빛으로 희망을 비추다’ 기획 전시다. 코로나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숨을 쉬며 함께 함을 전하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고즈넉한 고궁 옆 조형물이 밝히는 빛을 보고 시민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희망을 품을지 궁금하다.
높이 약 10m의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옛 국세청 4층 별관)가 있던 자리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건물을 헐고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뒤편 성공회 성당의 기단처럼 느껴지도록 몸을 한껏 낮췄다.
경사 지붕인 1층 ‘누리마루’는 평균 높이가 2.1m에 불과하다. 800㎡(242평)에 잔디를 깔고 옥상으로 튀어나온 엘리베이터 박스도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었다. 대신 지하로 12.7m 파고 내려가 지하 3층에 전시관을 꾸몄다. 그 덕에 1926년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공회 성당이 태평로에서 훤히 보인다. 영국 건축가 아더 딕슨의 작품으로 지붕에 적갈색 기와를 얹어 한국 전통 건축과 조화를 이른 이색 건물이다.
첨성대가 빛나는 건 천년고도 경주 지킴이로 국난을 이기고 천년을 버텼기 때문이다. 유물이든 인간이든 제자리서 제 몫을 다 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우리 주변엔 허명과 탐욕에 눈이 멀어 지켜야 할 가치를 저버린 채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꿰찬 몰염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무총장 재미가 어때?” 조크 성 질문엔 “매일 열화상 카메라에 출연하는 재미와 화장실에서 덕수궁 용마루를 내려다보며 소피보는 짜릿함”이라고 농담조로 응수한다. 덕수궁 전경과 돌담 옆 성공회 성당 건물들이 드론 사진처럼 시야 가득 들어온다.
코로나 공포 속에 출근하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1층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놓고 체크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된다. 사무실 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열화상 카메라를 무사히 통과했으니 검증됐다며 주먹 인사를 한다.
지난 5월 하순 어느 날 내려다보니 성공회 성당 앞에 첨성대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닌가. 도포자락에 갓을 쓴 선비가 도심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 생뚱맞다.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해 10월엔 ‘서울 마루 2019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인 ‘소풍 지붕(소통하는 풍선 지붕)’을 설치하면서 ‘누리마루’에 대형 풍선 수십 개를 띄워 주변 경관을 망쳤다는 지적의 재연이다.
경주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이 조형물은 자동차의 폐(廢) 헤드라이트를 재생시켜 밤이면 빛을 내는 작품 ‘환생’이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서울시 예산 65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했다. ‘천년의 빛으로 희망을 비추다’ 기획 전시다. 코로나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숨을 쉬며 함께 함을 전하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고즈넉한 고궁 옆 조형물이 밝히는 빛을 보고 시민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희망을 품을지 궁금하다.
높이 약 10m의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옛 국세청 4층 별관)가 있던 자리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건물을 헐고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뒤편 성공회 성당의 기단처럼 느껴지도록 몸을 한껏 낮췄다.
경사 지붕인 1층 ‘누리마루’는 평균 높이가 2.1m에 불과하다. 800㎡(242평)에 잔디를 깔고 옥상으로 튀어나온 엘리베이터 박스도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었다. 대신 지하로 12.7m 파고 내려가 지하 3층에 전시관을 꾸몄다. 그 덕에 1926년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공회 성당이 태평로에서 훤히 보인다. 영국 건축가 아더 딕슨의 작품으로 지붕에 적갈색 기와를 얹어 한국 전통 건축과 조화를 이른 이색 건물이다.
첨성대가 빛나는 건 천년고도 경주 지킴이로 국난을 이기고 천년을 버텼기 때문이다. 유물이든 인간이든 제자리서 제 몫을 다 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우리 주변엔 허명과 탐욕에 눈이 멀어 지켜야 할 가치를 저버린 채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꿰찬 몰염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