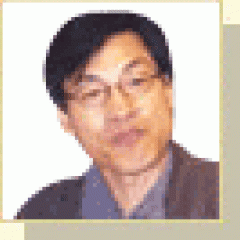꽃을 응원하다
꽃을 응원하다
by 한희철 목사 2018.08.01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서재 책상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보면 작은 공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성하게 자라 오른 잡초들이 이 땅은 내가 주인이라는 듯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나마 이렇게 된 것도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폐가와 같은 집이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역한 냄새에 코를 막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던 집이 헐린 것이니 비록 잡초가 자란다 하여도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터 앞을 지나면서 보니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터 바로 앞 전봇대 서 있는 곳에 <교차로> 신문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찾는 손길이 많았던 것일까요, 딱 한 장의 신문이 남아 있었는데 뭔가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집어 들고 보니 지난주 제가 썼던 칼럼이 맨 앞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시(詩) 한 줄만도 못한 시시한’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쓴 글을 생각지도 못한 한 공터 앞에서 만나다니,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공터에는 잡초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드물지만 코스모스며 해바라기며 몇몇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버려진 듯한 땅을 보기 좋은 정원으로 만드는 일은 꽃씨를 뿌리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버려진 공터를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잡초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꽃씨를 뿌릴 일이다 싶었습니다.
공터에서 자라는 꽃 중에는 대번 눈길을 끄는 꽃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다른 꽃들을 두고서 유난히 키가 큰 꽃이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공터 안쪽에 서 있는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해바라기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커서 부러질까 염려가 되어 그런 것인지, 부러진 적이 있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까만 플라스틱 막대기를 옆에 세우고 노끈으로 해바라기와 막대를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해바라기를 묶은 막대는 꽃에게 보내는 응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여기 있어 고맙다고,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얼마든지 꽃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바람에 흔들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해바라기 못지않게 꽃을 응원하는 누군가의 마음 또한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공터와 같은 세상을 볼 때 그런 모습 탓하기에 앞서 꽃씨를 뿌린다면, 키 큰 해바라기처럼 누군가의 어색하거나 위태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흉보는 대신 그가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막대기 하나 고인다면, 그 모든 것들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겠구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쓰는 소소한 칼럼도 누군가의 지친 삶을 향한 응원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그런 생각도 덤처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아침 공터 앞을 지나면서 보니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터 바로 앞 전봇대 서 있는 곳에 <교차로> 신문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찾는 손길이 많았던 것일까요, 딱 한 장의 신문이 남아 있었는데 뭔가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집어 들고 보니 지난주 제가 썼던 칼럼이 맨 앞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시(詩) 한 줄만도 못한 시시한’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쓴 글을 생각지도 못한 한 공터 앞에서 만나다니,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공터에는 잡초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드물지만 코스모스며 해바라기며 몇몇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버려진 듯한 땅을 보기 좋은 정원으로 만드는 일은 꽃씨를 뿌리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버려진 공터를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잡초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꽃씨를 뿌릴 일이다 싶었습니다.
공터에서 자라는 꽃 중에는 대번 눈길을 끄는 꽃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다른 꽃들을 두고서 유난히 키가 큰 꽃이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공터 안쪽에 서 있는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해바라기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커서 부러질까 염려가 되어 그런 것인지, 부러진 적이 있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까만 플라스틱 막대기를 옆에 세우고 노끈으로 해바라기와 막대를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해바라기를 묶은 막대는 꽃에게 보내는 응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여기 있어 고맙다고,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얼마든지 꽃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바람에 흔들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해바라기 못지않게 꽃을 응원하는 누군가의 마음 또한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공터와 같은 세상을 볼 때 그런 모습 탓하기에 앞서 꽃씨를 뿌린다면, 키 큰 해바라기처럼 누군가의 어색하거나 위태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흉보는 대신 그가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막대기 하나 고인다면, 그 모든 것들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겠구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쓰는 소소한 칼럼도 누군가의 지친 삶을 향한 응원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그런 생각도 덤처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