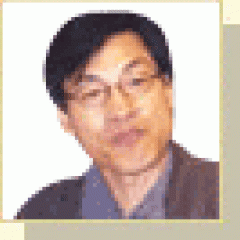아날로그 맛
아날로그 맛
by 이규섭 시인 2017.07.28

미식가도 아닌 잡식가인데 ‘나의 단골집’을 소개해 달라는 글 청탁을 받았다. 선뜻 떠오르는 곳이 없다. 취재 다니던 시절엔 그 지방 토속음식집을 즐겨 찾았다. 목포 민어횟집, 여수 간장게장집, 태안 낙지박속탕, 정선 장터의 콧등치기 국수, 마산 선창가 ‘복국’, 순흥 메밀묵밥집은 단골은 아니고 소문난 맛집일 뿐이다.
일터에 나갈 땐 부근에 단골 술집은 더러 있었다. 카드가 보편화 되지 않은 시절 주머니가 비었을 때 스스럼없이 들러 외상술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월급날 외상을 갚으러 가 공짜로 얻어먹는 술맛은 더 짜릿하다. 부담 없는 가격의 안주,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주인장의 친절이 삼박자로 어울리면 편안한 단골집이다.
지금은 사라진 종로 피맛골의 삼경원(三驚苑)이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그 집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하여 붙여진 상호 아닌 상호가 ‘삼경원’이다. 첫 번째는 실내가 비좁고 허름하여 놀란다. 탁자 네 개에 손님의 등은 맞닿기 일쑤다. 퇴색한 벽지에는 취객들이 휘갈겨 놓은 허언과 명언들이 어지럽다.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 아슬아슬하게 걸린 선반에는 브라운관 소형 텔레비전이 위태롭게 앉아 있어 불안하다. 낡은 문학잡지와 퇴색한 시집 몇 권이 시대극의 소품처럼 선반에 놓였다. 철거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가져다 전시하려 했으나 주인장이 사양한 집기들이다. 주방 귀퉁이 화장실은 소변기만 벽에 붙어있으나 출입문을 닫기조차 어려운 초미니 공간이다.
두 번째는 좁고 허름한 곳에 오는 단골들의 면면들이 화려해 놀란다. 문인, 화가, 서예가 등 예술가와 언론인들이 자주 들린다. 돌아앉으면 저절로 합석이 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불통시대를 소통하며 지냈다. 세 번째는 주인장의 미모와 위트에 놀란다.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든다. 안주는 주인장 맘 대로다. 그날 들여온 식재료에 따라 다르다. 메뉴는 파전, 오징어볶음 등 열 손가락 안이다. 값도 오천 원 균일이다.
단골들은 ‘그랜드플라자’라고도 하고, ‘×나게 아름다운 집’으로 통한다. 교보문고 뒤 피맛골에 30여 년 머물다 재개발에 밀려 인근 대형 빌딩 지하로 옮긴 지 여러 해다. 벽에는 낙서 대신 한 시대를 풍미한 문인들의 사진과 시가 걸렸다. 윤동주의 ‘서시’로 별을 헤고, 박목월의 ‘나그네’로 추억을 자맥질한다. 분위기는 깔끔하지만 삼경원 이미지는 아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려 내놓은 게 점심 백반 메뉴다. 조미료를 쓰지 않은 담백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이 혀끝을 감친다. 김치와 멸치볶음, 버섯·오이무침, 무채 등 제철 밑반찬은 어머니의 깊은 손맛으로 도심 직장인들의 ‘집밥’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식탁 수에 맞춰 예약제로 몇 팀만 받는다. 가격은 여전히 착하다. 주변 식당의 눈총을 받아가며 소주 한 병 3,000원을 고수하는 게 맘에 든다.
입맛이 사람마다 다르듯 맛집의 기준도 제각각이다. 먹방을 통해 소개되는 국적 불명의 디지털 맛보다 소박한 시골 밥상 같은 아날로그 맛이 내겐 더 살갑다.
일터에 나갈 땐 부근에 단골 술집은 더러 있었다. 카드가 보편화 되지 않은 시절 주머니가 비었을 때 스스럼없이 들러 외상술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월급날 외상을 갚으러 가 공짜로 얻어먹는 술맛은 더 짜릿하다. 부담 없는 가격의 안주,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주인장의 친절이 삼박자로 어울리면 편안한 단골집이다.
지금은 사라진 종로 피맛골의 삼경원(三驚苑)이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그 집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하여 붙여진 상호 아닌 상호가 ‘삼경원’이다. 첫 번째는 실내가 비좁고 허름하여 놀란다. 탁자 네 개에 손님의 등은 맞닿기 일쑤다. 퇴색한 벽지에는 취객들이 휘갈겨 놓은 허언과 명언들이 어지럽다.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 아슬아슬하게 걸린 선반에는 브라운관 소형 텔레비전이 위태롭게 앉아 있어 불안하다. 낡은 문학잡지와 퇴색한 시집 몇 권이 시대극의 소품처럼 선반에 놓였다. 철거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가져다 전시하려 했으나 주인장이 사양한 집기들이다. 주방 귀퉁이 화장실은 소변기만 벽에 붙어있으나 출입문을 닫기조차 어려운 초미니 공간이다.
두 번째는 좁고 허름한 곳에 오는 단골들의 면면들이 화려해 놀란다. 문인, 화가, 서예가 등 예술가와 언론인들이 자주 들린다. 돌아앉으면 저절로 합석이 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불통시대를 소통하며 지냈다. 세 번째는 주인장의 미모와 위트에 놀란다.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든다. 안주는 주인장 맘 대로다. 그날 들여온 식재료에 따라 다르다. 메뉴는 파전, 오징어볶음 등 열 손가락 안이다. 값도 오천 원 균일이다.
단골들은 ‘그랜드플라자’라고도 하고, ‘×나게 아름다운 집’으로 통한다. 교보문고 뒤 피맛골에 30여 년 머물다 재개발에 밀려 인근 대형 빌딩 지하로 옮긴 지 여러 해다. 벽에는 낙서 대신 한 시대를 풍미한 문인들의 사진과 시가 걸렸다. 윤동주의 ‘서시’로 별을 헤고, 박목월의 ‘나그네’로 추억을 자맥질한다. 분위기는 깔끔하지만 삼경원 이미지는 아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려 내놓은 게 점심 백반 메뉴다. 조미료를 쓰지 않은 담백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이 혀끝을 감친다. 김치와 멸치볶음, 버섯·오이무침, 무채 등 제철 밑반찬은 어머니의 깊은 손맛으로 도심 직장인들의 ‘집밥’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식탁 수에 맞춰 예약제로 몇 팀만 받는다. 가격은 여전히 착하다. 주변 식당의 눈총을 받아가며 소주 한 병 3,000원을 고수하는 게 맘에 든다.
입맛이 사람마다 다르듯 맛집의 기준도 제각각이다. 먹방을 통해 소개되는 국적 불명의 디지털 맛보다 소박한 시골 밥상 같은 아날로그 맛이 내겐 더 살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