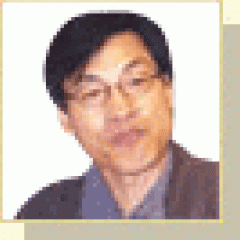채상의 무늬와 촉감 비단을 두른 듯
채상의 무늬와 촉감 비단을 두른 듯
by 이규섭 시인 2017.03.31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서한규 명예보유자가 22일 오전 8시 별세했다. 향년 87.’ 조간신문에 난 부음기사를 보며 “인간문화재 한 분이 또 가셨군.”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우리의 얼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취재해 왔기에 한 분 두 분 저 세상으로 거처를 옮길 때마다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
서한규 채상장을 만난 것은 댓 숲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차고 맵던 2005년 겨울이었다. 교육부 기관지의 인터뷰 의뢰를 받고 댓 고을 전남 담양을 찾았다. 담양천 제방 부근 시산마을에 위치한 그의 집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낡고 허름하지만 사각형 시멘트 기둥의 문패는 크고 선명하다. ‘중요무형문화재 53호 채상장 일죽 서한규’. 오석에 한자로 양각해 놓았다.
당시 일흔다섯의 일죽은 대나무를 품고 살아온 탓인지 대쪽처럼 꼬장꼬장하다. 공방에 들어서니 만들기 시작한 채상과 제작 도구들이 널려있다. 채상장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여 다채로운 기하학적 무늬로 고리를 엮는 기술을 지닌 장인이다. 조선 후기양반 사대부집안 뿐만 아니라 서민층에도 혼수품으로 유행했다. 옷, 장신구, 침선구, 귀중품을 담는 용기로 쓰였다.
또 다른 공방에는 염색해놓은 대오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삼합 등 제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제작 공정을 선보인다. 쪼갠 대를 일일이 손으로 잡아 조름판에 통과시켜 조름 썰기를 한다. 저민 대오리를 입으로 물고 겉껍질과 속껍질을 갈라낸다. 대나무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고 섬세하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하지만 장인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일이라 여간 고역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전승 공예를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맥을 잊는다는 게 녹록한 게 아니다. 천연염료인 치자와 쪽, 잇꽃과 갈매로 대오리를 물들여야 한다. 태극문양 등 무늬를 넣고 수(壽), 복(福)자 문자를 짜 새기며 채상을 만드는 공정은 까다롭다.
죽물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부채, 삿갓, 대자리를 만들며 가업을 이었다. 대자리가 하드보드 제품에 밀리고, 삿갓이 비닐우산 등장으로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부채로 명맥을 유지했다. 70년대 중반 선풍기가 보편화되면서 부채마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 무렵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할머니가 혼수로 가져왔다는 2합 채상이다. 엮었다간 풀고 다시 엮고 칠하면서 채상기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1977년 제2회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에 채상을 비롯, 대자리와 죽부인 등을 출품했다. 대자리는 특별상, 채상은 입선했다. 그 뒤 디자인은 예쁘게, 색상은 아름답게, 야무지게 채상을 만들기 위해 수 없는 공정을 되풀이한 결과 1982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서 진가를 공인받았다. 1987년 채상장 인간문화재로 우뚝 섰다. 2012년 딸 신정씨가 대를 이어 기능보유자로 선정됐다. 채상장은 떠났어도 그가 만든 채상의 무늬와 촉감은 비단을 두른 듯 우아하고 매끄럽다. 칠보단장 새색시처럼 고운 채상이 눈에 아롱거린다.
서한규 채상장을 만난 것은 댓 숲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차고 맵던 2005년 겨울이었다. 교육부 기관지의 인터뷰 의뢰를 받고 댓 고을 전남 담양을 찾았다. 담양천 제방 부근 시산마을에 위치한 그의 집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낡고 허름하지만 사각형 시멘트 기둥의 문패는 크고 선명하다. ‘중요무형문화재 53호 채상장 일죽 서한규’. 오석에 한자로 양각해 놓았다.
당시 일흔다섯의 일죽은 대나무를 품고 살아온 탓인지 대쪽처럼 꼬장꼬장하다. 공방에 들어서니 만들기 시작한 채상과 제작 도구들이 널려있다. 채상장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여 다채로운 기하학적 무늬로 고리를 엮는 기술을 지닌 장인이다. 조선 후기양반 사대부집안 뿐만 아니라 서민층에도 혼수품으로 유행했다. 옷, 장신구, 침선구, 귀중품을 담는 용기로 쓰였다.
또 다른 공방에는 염색해놓은 대오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삼합 등 제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제작 공정을 선보인다. 쪼갠 대를 일일이 손으로 잡아 조름판에 통과시켜 조름 썰기를 한다. 저민 대오리를 입으로 물고 겉껍질과 속껍질을 갈라낸다. 대나무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고 섬세하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하지만 장인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일이라 여간 고역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전승 공예를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맥을 잊는다는 게 녹록한 게 아니다. 천연염료인 치자와 쪽, 잇꽃과 갈매로 대오리를 물들여야 한다. 태극문양 등 무늬를 넣고 수(壽), 복(福)자 문자를 짜 새기며 채상을 만드는 공정은 까다롭다.
죽물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부채, 삿갓, 대자리를 만들며 가업을 이었다. 대자리가 하드보드 제품에 밀리고, 삿갓이 비닐우산 등장으로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부채로 명맥을 유지했다. 70년대 중반 선풍기가 보편화되면서 부채마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 무렵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할머니가 혼수로 가져왔다는 2합 채상이다. 엮었다간 풀고 다시 엮고 칠하면서 채상기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1977년 제2회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에 채상을 비롯, 대자리와 죽부인 등을 출품했다. 대자리는 특별상, 채상은 입선했다. 그 뒤 디자인은 예쁘게, 색상은 아름답게, 야무지게 채상을 만들기 위해 수 없는 공정을 되풀이한 결과 1982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서 진가를 공인받았다. 1987년 채상장 인간문화재로 우뚝 섰다. 2012년 딸 신정씨가 대를 이어 기능보유자로 선정됐다. 채상장은 떠났어도 그가 만든 채상의 무늬와 촉감은 비단을 두른 듯 우아하고 매끄럽다. 칠보단장 새색시처럼 고운 채상이 눈에 아롱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