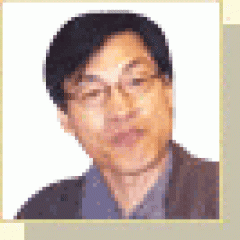달빛 품은 박
달빛 품은 박
by 이규섭 시인 2016.09.09

가던 날이 장날이다. 지방에서 강의를 마치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오일장이 섰다. 빨갛게 말린 고추, 붉게 물든 사과, 속이 꽉 찬 배추와 살이 통통한 무, 참깨와 완두콩, 오가피와 엄나무 등 약초, 알록달록 가을옷과 다양한 생필품을 파는 난전이 길게 이어졌다. 토종 풋고추를 사려고 채소 파는 곳을 기웃거렸으나 청양고추와 아삭이고추 뿐 보이지 않는다, 왜 풋고추가 없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일손이 부족한 데 누가 돈 안 되는 풋고추 따다 팔겠느냐”고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하얀 박에 눈길이 꽂혔다. 초가지붕에 달덩이 같은 박이 열리고 멍석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가 쪽빛 가을 하늘과 대조를 이루던 어릴 적 이맘때 고향 풍경이 떠오른다. 흙 담장을 타고 오른 박 넝쿨이 피어 올린 하얀 박꽃은 순백의 영혼을 닮아 애잔하다. 때 묻지 않은 소녀의 마음처럼 청순하다. 박꽃은 왜 밤에만 필까? 낮에 피는 화사한 꽃들은 벌과 나비가 수분을 시키지만, 박꽃은 박각시나방이 수분을 해준다. 박각시나방은 힘찬 날갯짓으로 다가와 몸보다 긴 주둥이로 꿀을 빨아 먹는다. 어둠이 내리면 ‘신랑인 박을 찾아오는 각시’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 해학적이고 정겹다.
박은 아기 주먹만 할 때는 잔털이 송송 난 초록 빛깔이다. 몸집을 불리면서 연초록빛을 띠다가 단단하게 여물면 흰 빛깔에 가깝지만 옅은 초록 빛깔이다. 그래도 박은 달빛을 품은 하얀 이미지로 각인되어 달덩이 같은 여인을 떠올리게 한다.
덜 여문 박으로 만든 박나물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애호박처럼 납작납작하게 썰어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아먹으면 식감이 부드럽다. 호박꼬지처럼 말려 놓았다가 겨울철에 볶아서도 먹었다. 예전엔 추석 차례상에 박을 넣은 탕국을 끓이기도 했다. 요즘도 남도지방 연포탕에는 무보다 박나물을 넣는다. 충청도 서산지역 밀국낙지탕에 빠지지 않는 게 박이다. 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갈까 망설였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들고 가기 불편하여 아쉽지만 포기했다.
박이 다 영글어 곁이 딱딱해지면 딴다. 이때 박덩이를 ‘박통’이라고도 한다. 꼭지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슬근슬근 톱질한다. 흥부네 박처럼 금은보화는 나오지 않아도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뽀얀 속살이 드러난다. 속살을 긁어내 무쳐 먹기도 했다. 잘라 낸 박통은 가마솥에 푹 삶는다. 삶은 반쪽의 안쪽을 긁어내고 겉껍질을 벗겨낸 뒤 말리면 노란 빛깔의 바가지로 탈바꿈된다.
바가지는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소중한 생활 용구로 쓰임새가 많았다. 간장을 떠내고 곡식을 퍼냈다. 바가지로 쌀을 씻어 돌을 가려냈다. 바가지로 퍼서 쭉 들이키는 물맛은 한결 시원하다. 바가지로 퍼서 하는 등 멱은 더 찌릿하다. 탈을 만들어 흥취를 돋우기도 했으니 박에는 한국의 정서가 고스란히 스며있다. 박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하여 한가위의 또 다른 서정이다. 달빛 품은 하얀 박처럼 순박한 웃음이 피어나고 소소한 행복이 소박하게 피어나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하얀 박에 눈길이 꽂혔다. 초가지붕에 달덩이 같은 박이 열리고 멍석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가 쪽빛 가을 하늘과 대조를 이루던 어릴 적 이맘때 고향 풍경이 떠오른다. 흙 담장을 타고 오른 박 넝쿨이 피어 올린 하얀 박꽃은 순백의 영혼을 닮아 애잔하다. 때 묻지 않은 소녀의 마음처럼 청순하다. 박꽃은 왜 밤에만 필까? 낮에 피는 화사한 꽃들은 벌과 나비가 수분을 시키지만, 박꽃은 박각시나방이 수분을 해준다. 박각시나방은 힘찬 날갯짓으로 다가와 몸보다 긴 주둥이로 꿀을 빨아 먹는다. 어둠이 내리면 ‘신랑인 박을 찾아오는 각시’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 해학적이고 정겹다.
박은 아기 주먹만 할 때는 잔털이 송송 난 초록 빛깔이다. 몸집을 불리면서 연초록빛을 띠다가 단단하게 여물면 흰 빛깔에 가깝지만 옅은 초록 빛깔이다. 그래도 박은 달빛을 품은 하얀 이미지로 각인되어 달덩이 같은 여인을 떠올리게 한다.
덜 여문 박으로 만든 박나물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애호박처럼 납작납작하게 썰어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아먹으면 식감이 부드럽다. 호박꼬지처럼 말려 놓았다가 겨울철에 볶아서도 먹었다. 예전엔 추석 차례상에 박을 넣은 탕국을 끓이기도 했다. 요즘도 남도지방 연포탕에는 무보다 박나물을 넣는다. 충청도 서산지역 밀국낙지탕에 빠지지 않는 게 박이다. 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갈까 망설였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들고 가기 불편하여 아쉽지만 포기했다.
박이 다 영글어 곁이 딱딱해지면 딴다. 이때 박덩이를 ‘박통’이라고도 한다. 꼭지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슬근슬근 톱질한다. 흥부네 박처럼 금은보화는 나오지 않아도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뽀얀 속살이 드러난다. 속살을 긁어내 무쳐 먹기도 했다. 잘라 낸 박통은 가마솥에 푹 삶는다. 삶은 반쪽의 안쪽을 긁어내고 겉껍질을 벗겨낸 뒤 말리면 노란 빛깔의 바가지로 탈바꿈된다.
바가지는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소중한 생활 용구로 쓰임새가 많았다. 간장을 떠내고 곡식을 퍼냈다. 바가지로 쌀을 씻어 돌을 가려냈다. 바가지로 퍼서 쭉 들이키는 물맛은 한결 시원하다. 바가지로 퍼서 하는 등 멱은 더 찌릿하다. 탈을 만들어 흥취를 돋우기도 했으니 박에는 한국의 정서가 고스란히 스며있다. 박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하여 한가위의 또 다른 서정이다. 달빛 품은 하얀 박처럼 순박한 웃음이 피어나고 소소한 행복이 소박하게 피어나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