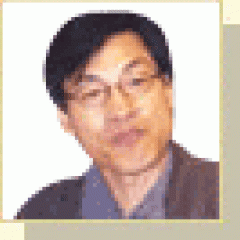모두가 시인이 되는 봄
모두가 시인이 되는 봄
by 한희철 목사 2016.04.06

천지사방 눈이 부십니다. 꽃들이 그렇고 연둣빛 이파리가 그렇습니다. 성급한 것 아닐까 싶게 핀 산수유 노란 빛깔이 조금씩 짙어갈 때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던 꽃들이 그럴 리야 하면서 맘껏 화답합니다. 개나리와 목련, 벚꽃과 진달래 등 원색으로 단장한 봄꽃들이 아우성을 치듯 피어납니다. 꽃들의 빛깔 행여 흐릴까, 연둣빛 이파리들은 당분간 꽃들을 위한 배경색에 머무르기로 한 것 같고요.
꼭대기부터 하얀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한 목련은 마치 만년설을 이고 있는 높은 산꼭대기 같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겨울 추위를 이겨낸 모든 소소한 것들이 위대한 것임을 지긋하게 일러줍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온통 얼룩지게 만든 사나운 비 끝에도 여전히 순백의 빛을 지키는 목련이 대견하다 싶습니다.
봄꽃 피듯 봄이 되면 떠오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나태주의 <풀꽃>이 앞장을 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마치 예쁜 꽃잎 하나 입에 문 듯 짧은 시를 되뇌면 마음속으로 향기가 퍼집니다. 김지하의 <새봄>도 그렇습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고은의 <그 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언감생심 시인이 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만, 이처럼 눈부신 계절에 시인 아니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고,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봄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봄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습니다.
“행여 꽃잎 떨굴까/ 내리는 봄비/ 조심스럽고// 행여 미안해할까/ 떨어진 꽃잎/ 해맑게 웃고”
“너무 쉽게 진다/ 너무 쉽게 밟진 마세요/ 언제 한 번 맘껏 웃은 적 있는지/ 굳이 묻지 않잖아요”
“눈길 한 번에/ 화인(火印) 되고// 손길 한 번에/ 화인(花印) 되고”
“모두가 본 것을 보았다면/ 모두가 들은 것을 들었다면/ 덩달아 말했겠지요/ 두 팔 벌려/ 그냥 웃는 이유를/ 당신이야 아시겠지요”
“묻지 않을래요/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도/ 아니 계신 곳/ 따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구구/ 시방 사월인디/ 이게 웬 뜬금읍는 추위라냐/ 꽃들이 춥겁다/ 여벌 옷두 읍구만”
“아무도 모르게 견딘/ 추위 속 아픔/ 모르셔도 됩니다/ 누구도 모르게 견딘/ 어둠 속 외로움/ 모르셔도 되고요/ 다만 당신께는/ 웃고 싶을 뿐/ 하나의 웃음이고 싶을 뿐/ 나머지는/ 제 마음 아니니까요”
“봄은 겨울의 대안인가요/ 물었을 때/ 누군가 웃으며 말씀하시는 듯 했다/ 아니/ 대안이 아니라 대답이란다”
봄은 모두를 시인으로 초대하는 계절일지 모릅니다. 꽃들도 웃을까요? 혼자서 흥얼거리는 소리들을, 꽃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대답하는 마음속 대답들을 들으면 말이지요.
꼭대기부터 하얀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한 목련은 마치 만년설을 이고 있는 높은 산꼭대기 같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겨울 추위를 이겨낸 모든 소소한 것들이 위대한 것임을 지긋하게 일러줍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온통 얼룩지게 만든 사나운 비 끝에도 여전히 순백의 빛을 지키는 목련이 대견하다 싶습니다.
봄꽃 피듯 봄이 되면 떠오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나태주의 <풀꽃>이 앞장을 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마치 예쁜 꽃잎 하나 입에 문 듯 짧은 시를 되뇌면 마음속으로 향기가 퍼집니다. 김지하의 <새봄>도 그렇습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고은의 <그 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언감생심 시인이 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만, 이처럼 눈부신 계절에 시인 아니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고,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봄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봄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습니다.
“행여 꽃잎 떨굴까/ 내리는 봄비/ 조심스럽고// 행여 미안해할까/ 떨어진 꽃잎/ 해맑게 웃고”
“너무 쉽게 진다/ 너무 쉽게 밟진 마세요/ 언제 한 번 맘껏 웃은 적 있는지/ 굳이 묻지 않잖아요”
“눈길 한 번에/ 화인(火印) 되고// 손길 한 번에/ 화인(花印) 되고”
“모두가 본 것을 보았다면/ 모두가 들은 것을 들었다면/ 덩달아 말했겠지요/ 두 팔 벌려/ 그냥 웃는 이유를/ 당신이야 아시겠지요”
“묻지 않을래요/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도/ 아니 계신 곳/ 따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구구/ 시방 사월인디/ 이게 웬 뜬금읍는 추위라냐/ 꽃들이 춥겁다/ 여벌 옷두 읍구만”
“아무도 모르게 견딘/ 추위 속 아픔/ 모르셔도 됩니다/ 누구도 모르게 견딘/ 어둠 속 외로움/ 모르셔도 되고요/ 다만 당신께는/ 웃고 싶을 뿐/ 하나의 웃음이고 싶을 뿐/ 나머지는/ 제 마음 아니니까요”
“봄은 겨울의 대안인가요/ 물었을 때/ 누군가 웃으며 말씀하시는 듯 했다/ 아니/ 대안이 아니라 대답이란다”
봄은 모두를 시인으로 초대하는 계절일지 모릅니다. 꽃들도 웃을까요? 혼자서 흥얼거리는 소리들을, 꽃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대답하는 마음속 대답들을 들으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