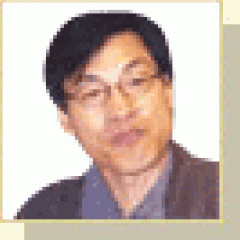버릴 수 없는 기억
버릴 수 없는 기억
by 한희철 목사 2019.07.17

사람의 기억을 담는 창고는 얼마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한대의 기억이 담기지는 않을 터, 얼마만큼의 기억이 담기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창고라면 창고는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는 곳, 무조건 쌓아둘 수 있는 창고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다 찼다 싶으면 무언가를 비워내야 비워낸 만큼을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기억의 창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목회를 하는 저는 요즘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교우의 가정을 찾아가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어서 찾아가는 사람이나 맞는 교우들이나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에게도 꺼내 놓기 힘들었던 속에 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교우들 가정을 심방하던 중에 하루는 따로 시간을 내어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건강했을 때야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이제는 연로하여 요양원에서 지내는 몇몇 어른들이 있습니다. 연세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그분들이 다시 교회를 찾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럴수록 심방 중에 찾아뵙는 것은 도리다 싶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요양원은 북한산 인수봉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양화 화폭 속에 자리를 잡은 듯싶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고, 공기도 맑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직원이 교우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흔을 넘긴 할머니 권사님은 착한 치매가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을 물어도 가만 웃으시며 짧은 대답만을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권사님이 몸에 두르고 있는 포대기 안에 무엇인가 담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으로 만든 작은 아기 인형이었는데, 얼마나 만졌는지 손때가 탄 인형이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당신이 살아오신 삶의 많은 순간들을, 어쩌면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얼굴도 어떤 것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어쩌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도로 아이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권사님에겐 끝내 버리지 못한 마지막 기억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는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아무리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도 어린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젖을 물리던 모정이었던 것이지요. 권사님이 포대기를 두르고 가슴으로 안은 작은 아기 인형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권사님이 버릴 수 없는 마지막 기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창고를 비운다면 마지막까지 남을 기억은 내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요즘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교우의 가정을 찾아가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어서 찾아가는 사람이나 맞는 교우들이나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에게도 꺼내 놓기 힘들었던 속에 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교우들 가정을 심방하던 중에 하루는 따로 시간을 내어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건강했을 때야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이제는 연로하여 요양원에서 지내는 몇몇 어른들이 있습니다. 연세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그분들이 다시 교회를 찾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럴수록 심방 중에 찾아뵙는 것은 도리다 싶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요양원은 북한산 인수봉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양화 화폭 속에 자리를 잡은 듯싶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고, 공기도 맑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직원이 교우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흔을 넘긴 할머니 권사님은 착한 치매가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을 물어도 가만 웃으시며 짧은 대답만을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권사님이 몸에 두르고 있는 포대기 안에 무엇인가 담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으로 만든 작은 아기 인형이었는데, 얼마나 만졌는지 손때가 탄 인형이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당신이 살아오신 삶의 많은 순간들을, 어쩌면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얼굴도 어떤 것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어쩌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도로 아이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권사님에겐 끝내 버리지 못한 마지막 기억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는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아무리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도 어린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젖을 물리던 모정이었던 것이지요. 권사님이 포대기를 두르고 가슴으로 안은 작은 아기 인형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권사님이 버릴 수 없는 마지막 기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창고를 비운다면 마지막까지 남을 기억은 내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입니다.